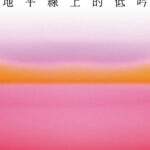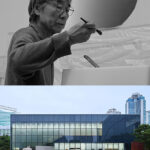2 Galerie Eigen + Art 사진 Linda Nylind. 사진 제공 Linda Nylind, 프리즈 아트 페어
2003년 처음 시작한 프리즈 런던은 런더너가 가장 사랑한다는 도심 속 공원 리젠트 파크에 펼쳐진 텐트에서 열린다. 대개의 아트 페어가 컨벤션 센터에 부스를 만들어 그야말로 미술 ‘산업’의 현장을 보여주는 반면, 프리즈는 낙엽 뒹구는 런던의 가을 정취 한가운데에 있다. 하얀 가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내로라하는 세계 최고의 갤러리들이 어깨를 부대끼며 서 있다. 텐트라는 기발한 전시 공간은 런던의 고밀도 덕에 고안된 아이디어. 2003년 미술 잡지 <프리즈>를 운영하던 아만다 샤프와 매슈 슬로터버는 아트 페어를 론칭하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했지만 고밀도로 악명 높은 런던 도심에서 페어를 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고심 끝에 이들은 벼룩시장처럼 반짝 생겼다 없어지는 텐트형 페어를 생각했다. 그것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조깅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도심 한복판 리젠트 파크에서!
‘텐트’, 그리고 런던 한복판의 ‘공원’. 이 두 조합만으로도 프리즈는 충분한 개성을 빚는다. 런던이 어떤 곳인가. 고물가에 시달리며 플랫(아파트) 한 칸에 몸을 맡기고 있는 처지에도 길거리 예술가의 예술혼을 살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즐비한 문화 도시 아닌가. 프리즈는 바로 이 지점을 강점이자 정체성으로 삼는다. VVIP 컬렉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호주머니는 가벼우나 기괴한 예술마저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런던의 일반인들까지 포용하는 아트 페어로 꾸려가기로 한 것이다. 프리즈 런던은 영국을 현대미술의 심장으로 만든 삼각 편대로 불린다. 프리즈가 시작된 2000년대 초는 데이미언 허스트 등이 이끄는 yBa(Young British Artists) 붐이 한창이었고, 여기에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테이트 모던이 막 개관(2000년)해 영국 현대미술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무렵이었다. 작가도 있고, 그걸 보여주는 미술관도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이런 붐을 받쳐줄 미술 시장이 부족했다. 잡지사 ‘프리즈’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트 페어를 시작했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아트 페어로 성장했다.
4 독일 갤러리 Bucholz에서 출품한 마크 레키의 작품. 사진 Linda Nylind 사진 제공 Linda Nylind, 프리즈 아트 페어
5 컨템퍼러리 이전의 예술을 다루는 프리즈 마스터스(Frieze Masters 2015)에 참가한 Karsten Schubert/Tomasso Brothers Fine Art 갤러리. 사진 Mark Blower 사진 제공 Mark Blower, 프리즈 아트 페어
지난 10월 13일에서 17일까지 런던 도심 리젠트 파크에서 열린 2015 프리즈 런던은 그 어느 때보다 프리즈의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한껏 보여줬다. 올해는 27개국 1백64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예술은 백만장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부스스한 얼굴로 전시장을 누비고 다니던 빅토리아 시달 디렉터가 전시장 안 카페에서 숨을 고르면서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프리즈 아트 페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2003년 시작된 프리즈는 2012년에 컨템퍼러리 이전의 예술을 다루는 ‘프리즈 마스터스’를, 2014년에 ‘프리즈 뉴욕’을 각각 시작하면서 가지를 뻗어나갔다. 이 세 가지를 합쳐 ‘프리즈 아트 페어’라 부르며, 빅토리아 시달은 이 세 페어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이제 서른여덟의 나이. 서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순수예술을 다루는 미술계는 예외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이다. 이 바닥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이 수장을 맡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리즈가 얼마나 젊은 감각을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프리즈는 젊어요. 컬렉터도 일반 관람객들도 젊지요. 미술 시장은 늙수그레한 중년 백인 남자들이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도전이랍니다.” 그녀가 플랫 슈즈를 고쳐 신으며 말했다. 젊은 관객일수록 ‘디테일’에 예민하다. 매년 갤러리마다 가지고 나오는 작품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형태나 무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관객은 금방 싫증 낸다. 이런 이유로 프리즈는 매년 텐트 디자인을 바꾸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레스토랑까지 큐레이팅한다. 일례로 올해 텐트 디자인은 런던올림픽 횃불을 디자인한 에드워드 바버와 제이 오스거비가 맡았다.
7 ‘진짜 같은 가짜’를 빚어내는 극사실주의 작가 존 드 안드레아의 작품 ‘시에라’.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프리즈 아트페어
부스가 빼곡히 들어찬 전시장 한가운데 침실 6개가 생겼다. 베개, 이불까지 완비! 침대마다 갤러리 부스 수백 개를 돌다 예술에 ‘물린’ 관람객들이 하나둘 침대 위에 널브러졌다. 중요한 건 거미줄처럼 콘센트 곳곳에 꽂혀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다. 살짝 눈 붙이고 허기 채우듯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관람객들은 집에서처럼 휴식을 취한다. 이 작품은 영국 아티스트 그룹 ‘AYR’이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까지 남과 공유하게 하는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 ‘Comfort Zone’이다. 잠자면서도 스마트폰을 곁에 둬야 안심하는 디지털 시대의 서글픈 초상이기도 하다.
전시장 중간엔 ‘탈의 불필요’란 주의 사항을 써두고 일본 작가 가가 미켄이 1인용 책상에 앉아 마주한 관객의 얼굴을 쓱 훑었다. 그가 눈을 둔 건 얼굴인데 30초 만에 그린 건 얼굴이 아니다. 여성 관객에겐 가슴을, 남성 관객에겐 성기를 그려줬다.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 속 도형처럼 변한 자신의 ‘주요 부위’ 드로잉을 받아 든 이들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작품가격은 ‘0원’. 부자 컬렉터가 아니어도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 전통적 누드화의 관습을 뒤틀고, 수십억, 수백억원이 넘는 작품이 오가는 아트 페어의 상업 논리를 보기 좋게 옆차기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프리즈 전시장엔 고가의 미술품 사이 군데군데 미술의 상업성을 비트는 예술 실험이 숨어 있었다. 13일 VIP 대상 사전 오픈엔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과 그의 부인 루치아나 바로소, 운동화 차림의 베네딕트 컴버배치, 후줄근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엠마 톰슨,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가 전시장을 오가고, ‘세계 10대 컬렉터’ 중 하나인 중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 부디 텍이 유명 아트 딜러 제프 다이치를 대동하며 화이트 큐브, 페로탱, 가고시안 등 톱 갤러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들 셀러브리티들만이 전시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공식 오픈부터는 일반인 관객이 넘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관람객 85%가 일반인이었다. “고물가에 시달려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아도 예술 취향만은 뚜렷한 런더너들과 예술을 나눠야 한다는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예술을 많이 집어넣었지요.” 프리즈 측의 얘기다. 예술을 공공재로 받아들이며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인에게 공짜로 개방하는 영국의 예술 전통이 미술을 사고파는 자본의 장에서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