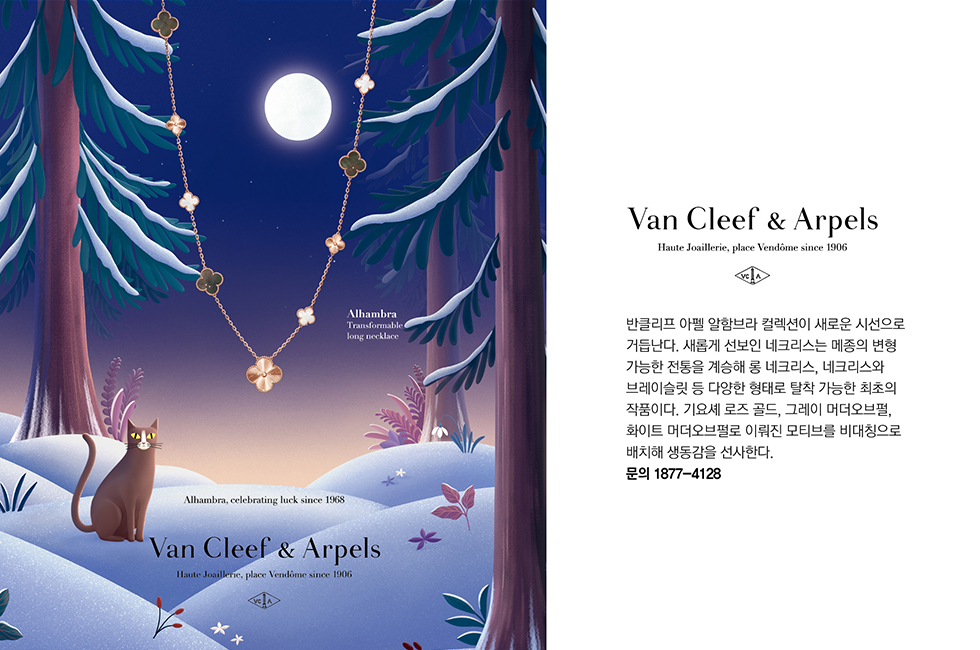7월 04, 2018
글 류지현(디자이너, <사람의 부엌> 저자)
북유럽 디자인, 이탈리아 디자인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덜란드 디자인 역시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진 지는 꽤 오래됐다. 디자인 세계에서도 유행은 피고 진다지만, 끊임없이 실험하고 혁신에 도전하면서 일상 속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자세야말로 문화 예술 강국으로 성장해온 네덜란드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초에 등장한 드로흐(Droog) 그룹의 존재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현대인의 일상은 디자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손에 든 커피잔도, 졸린 눈을 비비며 겨우 올라타는 지하철도, 지하철역 벽면에 가득 붙어 있는 포스터도 모두 디자인 과정을 거쳤다. 디자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대학 시절, 도서관 한구석에서 일상의 디자인을 담은 백과사전식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에코 디자인 핸드북>. 당시에는 한국에서 관심이 크지 않았던 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낯설고 어려운 테크놀로지 제품의 디자인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 친숙한 디자인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가득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프로젝트를 모아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공통분모가 나왔다. 바로 ‘네덜란드 디자인’이었다.
드로흐(Droog), 단순하지만 재치 있게
크게 보자면 네덜란드 문화에서 탄생한 디자인 작업을 모두 네덜란드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디자인이라고 하면 일련의 네덜란드의 제품이나 가구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은 네덜란드 디자인이란 명칭은 드로흐(Droog, 네덜란드어로 건조하다는 의미)와 함께 성장했다. 드로흐는 1990년대 초 제품·장신구 디자이너인 헤이스 바커르(Gijs Bakker)와 디자인 이론가 레니 라마커르스(Renny Ramakers)가 설립한 디자인 브랜드다. 위트를 담은 단순한 디자인을 표방하는 드로흐의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네덜란드 디자인의 큰 기둥을 세웠다. 의자 등받이를 장착한 통나무는 벤치가 되고(Tree Trunk Bench, Jurgen Bey) 전구 포장재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벽 등이 된다(Sticky Lamp Wall Lamp, Chris Kabel). 여러 용도에 맞춰 행주 걸이, 조리용품 걸이나 서랍 등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기능성 부엌 타일(Function tiles, Arnout Visser, Erik Jan Kwakkel, Peter Van der Jagt)은 타일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테요 레미(Tejo Remy)의 버려진 서랍들을 한데 모아 만든 듯한 서랍장(Chest of Drawers)이나 입지 않는 옷을 쌓아 만든 듯한 안락의자(Rag Chair) 같은 전통적인 산업 디자인 영역 밖의 디자인은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폭넓은 소비는 이런 네덜란드 디자인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왔다.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한 궂은 날씨 탓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실내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가구나 물건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네덜란드가 속한 지역이었던 플랑드르의 미술에 정물화나 실내 배경의 그림이 비교적 많다는 점에서도 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새로움을 통한 문화의 확장
인구 1천7백만 명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작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다. 거대 강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던히 애써온 환경 때문인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타 문화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어에 능통한 네덜란드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터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땅콩 사테 소스를 피넛 버터로 서양화한 것도 네덜란드인들이다. 실험적인 드로흐 디자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런 문화적 성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덜란드 디자인의 또 다른 관심은 새로운 소재 개발과 이용에 있다. 매년 네덜란드 디자인 주간에 열리는 ‘신소재 경진대회(New Material Award)’는 신소재와 새로운 적용 방식 개발을 지원하며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의 실험 의지를 북돋는 혁신의 장이다. 스튜디오 디르크 판 데르 코이(Studio Dirk Van der Kooij)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로봇 팔을 이용해 녹인 폐플라스틱을 똬리처럼 쌓아올려 가구를 만든다. 찰흙으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신기술과 공예를 접목하는 올리비에르 판 허르트(Olivier Van Herpt) 같은 디자이너도 있다. 정부 차원의 뒷받침도 든든하고 효율적이다. 유럽인에 대한 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를 지원한다. 네덜란드 국적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외국 인재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를 확장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도 태생의 제품 디자이너인 사티엔드라 파칼레(Satyendra Pakhale´)나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인 듀오 포르마판타스마(Formafantasma)는 자신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 성장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드로흐가 네덜란드 디자인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됐다. 당시 참신하게 다가왔던 디자인들은 이제 익숙한 디자인이 되었고, 네덜란드 스타일이라는 이름표가 쉽게 붙는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디자인은 여전히 글로벌 디자인 생태계에서 여전히 비중 있는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쉬지 않고 실험하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25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드로흐가 네덜란드 디자인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지 올해로 25주년이 됐다. 당시 참신하게 다가왔던 디자인들은 이제 익숙한 디자인이 되었고, 네덜란드 스타일이라는 이름표가 쉽게 붙는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디자인은 여전히 글로벌 디자인 생태계에서 여전히 비중 있는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쉬지 않고 실험하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25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ART+CULTURE ’18 SUMMER SPECIAL]
-Charms of Glocalness 기사 보러 가기
-Humanistic Elegance 기사 보러 가기
-The Essence of Dutch Creativity 기사 보러 가기
-Design Thinking: The Eindhoven Way 기사 보러 가기
-Eileen Gray & Le Corbusier 기사 보러 가기
-외부에 있는 나의 기억 기사 보러 가기
-국경 넘어 나래 펼치는 한국 미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사 보러 가기
-‘아트 허브’ 전쟁, 도시 중심에 성전 대신 미술관을 짓다 기사 보러 가기
-미술관 너머, 일상으로의 여행 기사 보러 가기
-RYUICHI SAKAMOTO: LIFE, LIFE 기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