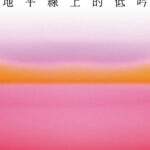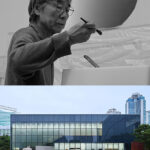11월 16, 2016
글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전시 기획자)
필자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현대미술 컬렉션의 필요성과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해왔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에 미술품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화재 기근에 당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국의 문화재만 수집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 아시아의 대표적 미술품을 갖춰놓아야 추후에 아시아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권력에 편승해 이권을 챙기기 좋은 단기적, 또는 홍보성이 강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게 함으로써 혈세를 유용했다. 그런 와중에 정작 한 국가의 장기적인 문화적 체력을 담당해야 할 분야에는 적은 예산이 배정돼왔다. 한국 문학의 번역 출판, 예술 꿈나무의 성장 지원, 지역 문화 시설의 확충 등이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근현대미술 공공 컬렉션이다. 한 해에 수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간다. 이들이 많은 돈을 쓰며 여행하는 행선지는 유럽과 미국이다. 한국인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관광의 상당 부분은 미술관 관람, 자연 명소 방문, 식도락, 쇼핑 등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술품 컬렉션이다.
현대미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사업의 핵
대영박물관 같은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곳조차 대부분의 전시물은 미술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1백50년 동안 이뤄진 근현대미술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서구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세기에 걸쳐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 비즈니스로 검증된 것이다. 각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현대미술품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전시할 장소를 건립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상파 미술관인 오르세 미술관이나 로댕, 피카소 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근대미술 전문 미술관이 정부 지원으로 개축됐을 뿐 아니라 퐁피두, 팔레 드 도쿄, 파리 시립미술관, 메츠 퐁피두 등을 위시해 소위 FRAC이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컬렉션을 포함한 국공립 미술관이 수많은 관광객을 동원하고 있다.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 까르띠에 현대미술관 등과 같은 엄청난 개인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미술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미술 콘텐츠들이 관광객에게서 벌어들이는 돈은 무려 수백조원에 이른다.
해마다 미술,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에서도 페기 구겐하임과 프라다 컬렉션, 그리고 구찌와 크리스티를 소유한 프랑스와 피노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팔라초 그라시, 푼타 델라 도가나 등 많은 개인 컬렉션이 엄청난 규모로 미술계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단 5일 동안 2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아트 페어를 위시해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컨벤션을 운영하는 작은 도시 바젤을 유럽 문화의 거점 도시로 만든 데는 바이엘러 재단의 미술품 컬렉션과 미술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구겐하임, 게티 미술관 등 미술관들은 모두 20세기 초 개인 컬렉션에서 출발해 공공 미술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서구 도시에 가면 우선 미술관부터 둘러보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컬렉션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리움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있다. 이 두 컬렉션 덕분에 한국 문화는 간신히 미술품 콘텐츠의 기근을 그마나 면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6천 점이 넘는 미술품이 소장돼 있지만 이 중 현대미술사의 맥락에 비춰 평가할 만한 작품은 10%가 채 안 된다고 본다. 연 30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국가적 컬렉션 구축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로 공공기관에 작품을 ‘미관용’으로 대관하는 미술 은행의 컬렉션 수준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는 거의 논의나 관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최근 들어 컬렉션을 갖추기 시작한 곳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연 10억원대의 미미한 미술품 컬렉션을 하고 있고, 그나마 대표작이 아닌 추천작을 시장가격을 크게 밑도는 도매가로 겨우 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한’ 공공 컬렉션은 당장은 돈을 아끼는 듯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품 가격이 오르거나 대표작을 찾기가 어려워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열악한 세제나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민간 컬렉션이 공공 컬렉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공공 컬렉션의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해마다 미술,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에서도 페기 구겐하임과 프라다 컬렉션, 그리고 구찌와 크리스티를 소유한 프랑스와 피노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팔라초 그라시, 푼타 델라 도가나 등 많은 개인 컬렉션이 엄청난 규모로 미술계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단 5일 동안 2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아트 페어를 위시해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컨벤션을 운영하는 작은 도시 바젤을 유럽 문화의 거점 도시로 만든 데는 바이엘러 재단의 미술품 컬렉션과 미술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구겐하임, 게티 미술관 등 미술관들은 모두 20세기 초 개인 컬렉션에서 출발해 공공 미술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서구 도시에 가면 우선 미술관부터 둘러보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컬렉션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리움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있다. 이 두 컬렉션 덕분에 한국 문화는 간신히 미술품 콘텐츠의 기근을 그마나 면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6천 점이 넘는 미술품이 소장돼 있지만 이 중 현대미술사의 맥락에 비춰 평가할 만한 작품은 10%가 채 안 된다고 본다. 연 30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국가적 컬렉션 구축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로 공공기관에 작품을 ‘미관용’으로 대관하는 미술 은행의 컬렉션 수준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는 거의 논의나 관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최근 들어 컬렉션을 갖추기 시작한 곳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연 10억원대의 미미한 미술품 컬렉션을 하고 있고, 그나마 대표작이 아닌 추천작을 시장가격을 크게 밑도는 도매가로 겨우 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한’ 공공 컬렉션은 당장은 돈을 아끼는 듯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품 가격이 오르거나 대표작을 찾기가 어려워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열악한 세제나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민간 컬렉션이 공공 컬렉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공공 컬렉션의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의 현대미술 컬렉션 열풍
현재 아시아에는 컬렉션 열풍이 불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화교 자본이 주축이 되어 각 도시에 메가 미술관을 짓고 있다. 2019년에 개관하는 홍콩의 M+는 3천5백억원대의 아시아 현대미술 컬렉션을 이미 6~7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 미술관이 문을 열면 아시아 관광객들은 단지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라도 홍콩을 방문할 것이다. 안 그래도 ‘콘텐츠’에 목말라하는 관광객에게는 아트 바젤 홍콩과 크리스티, 소더비 경매, 그리고 세계적 갤러리들의 분관과 면세 혜택까지 곁들인 홍콩이 아시아의 뉴욕처럼 여겨질 것이다. 상하이에는 이미 10여 개에 이르는 민관 주도의 메가 미술관이 건립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새로운 관광,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 아시아를 대상으로 공공 컬렉션과 페어를 기획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화교 자본까지 가세해 아시아 전역의 현대미술 대표작을 수집하고 있다. 미술품은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펑펑 써도 미술품에는 인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빠르게 순환하는 콘텐츠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발품을 팔아 서서히 구축해야 하는 미술품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최선의 시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 축재로 사라진 문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2백억씩 5년 동안 현대미술 국가 컬렉션을 구축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가는 공공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류로 높아진 아시아인들의 관심에 대해 그들의 문화를 한 군데에서 보여주는 아시아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그렇게 창조되는 ‘국가 컬렉션’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시한 전국의 문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아시아 각국으로 대여하면서 아시아 문화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 컬렉션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고급문화 영역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직결되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최선의 시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 축재로 사라진 문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2백억씩 5년 동안 현대미술 국가 컬렉션을 구축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가는 공공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류로 높아진 아시아인들의 관심에 대해 그들의 문화를 한 군데에서 보여주는 아시아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그렇게 창조되는 ‘국가 컬렉션’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시한 전국의 문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아시아 각국으로 대여하면서 아시아 문화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 컬렉션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고급문화 영역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직결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