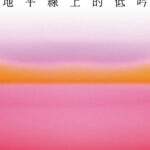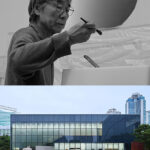‘혼밥’, ‘혼술’, ‘혼커’, ‘솔로 여행족’, ‘1인 창업자’ 등 혼자 놀고 쉬고 일하기를 선호하는 ‘나 홀로족’이 눈에 많이 띈다. 벗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솔로’를 고집하는 것이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언제나 ‘접속’ 상태인 디지털 생활 방식에 시달리는 인간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홀로움’의 미학을 추구하는 건 생존 본능이자 지혜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혼자 있는 고통을 ‘외로움(loneliness)’으로, 혼자 있는 즐거움을 ‘고독(solitude)’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고독력(孤獨力) 예찬론자들의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보자.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휘둘리는 우리는 혼자가 됐을 때야 비로소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경선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과 나를 위한 배려의 시간’이라고 했다. 자아를 성찰해야만 마음속 정직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타인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힘도 생긴다는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스마트 세상’에서는 오롯이 혼자가 될 시간을 갖기 어렵지 않은가. 온종일 ‘연결돼 있는(connected)’ 터라 소통의 덫에 치이기 십상이고, 인간관계망에서 훌훌 벗어나기도 힘들다(‘접속’된 상태인데도 외려 더 외로워진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요즘 일이든 취미 생활이든 여가든 혼자 하기를 선택하는 ‘나 홀로족’이 증가하는 현상은 단지 주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즐기고자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엇’도, ‘접속 인간’도 아닌, 그저 순수한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을 늘려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쯤 됐을까.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런던으로 건너와 일하던 한 제품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처음 이주했을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자 제일 좋게 느낀 점을 꼽자면 회사 일을 마치면 혼자 펍(pub)에 가서 맥주 한잔을 하고 귀가하는 루틴이라고. 뉴욕만 해도 혼자 바 같은 곳에 가면 다소 외톨이처럼 느껴졌지만, 런던에서는 홀로 조용히 맥주잔을 비우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이 꽤 흔한지라 남의 눈치 볼 일이 없어 편했다는 얘기였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머지 역동적인 ‘불금’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찍 귀가해 혼자만의 식도락과 엔터테인먼트를 택하는 싱글족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외식을 홀로 즐긴다는 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세상은 그새 달라졌다. 얼마 전 tvN에서 인기를 끈 월화극 <혼술남녀>에서도 다뤘지만, 요즘 외식 트렌드 중 하나는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커피 마시는 ‘혼커’, 혼자 술 마시는 ‘혼술’ 같은 ‘나 홀로 식음(食飮)’이다. 물론 정말로 원하는 타이밍에 지인이나 벗을 대동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애써 동행인을 찾지 않고 일부러 ‘솔로(solo)’를 택하는 행태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혼술혼밥족’은 말한다. 규칙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온전히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먹고 마시기를 선호한다고. 예컨대 천천히 먹든 빨리 먹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생선 요리에는 화이트 와인, 육류에는 레드 와인을 곁들이는 식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온전히 내 감각, 내 취향이 흘러가는 대로 즐기면 된다. 누군가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 없이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함도 이점이다. 혼술족의 경우는 자주 가는 술집에서 마주치는 주인장이나 단골손님들과 일종의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문득 대화가 그리워지면 어렵지 않게 말 상대를 찾을 수 있다. ‘홀로움’을 즐긴다는 전제가 있기에 서로 배려하는지라, 너무 친밀하지도 낯설지도 않은 부담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예 어디론가 홀로 떠나 단기 체류를 하는 ‘한 달 살기’ 열풍도 불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여행으로는 제대로 된 ‘혼자 놀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내든 해외든 원하는 곳에서 적어도 한 달 동안 충분히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휴학생이나 졸업생 중 청춘의 방랑을 핑계 삼아 ‘한 달 살기’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이력서의 공백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 한 달 이상은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체류비가 부족할 때는 숙식을 해결해주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거나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한다. 제주도에 가면 이처럼 ‘알바’를 하면서 ‘한 달 살기족’으로 지내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여행이나 체류의 장점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창조력이 증대된다는 점을 꼽는다.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면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게 되므로 일종의 ‘각성’을 하기도 하고, 천진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신한 발상을 꽃피울 수도 있다는 논리다. ‘자아 찾기’가 아주 잘 진행된 경우에는 심지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정신적으로 새롭게 발동을 걸게 되기도 한다고 여행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커리어 중간중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심도 있는 재충전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편종형 곡선’을 타는 유형도 있다. 70대가 되어서도 사회에 생산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면 과거처럼 서서히 올라가다가 은퇴와 동시에 절벽처럼 가파르게 미끄러지지 않고, 여러 개의 종을 늘어놓은 것 같은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이다. 20대에 열심히 한 우물을 파다가 30대가 되면 1년 동안 일을 쉬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한 다음 직장으로 돌아오고, 40대에 다시 한 번 다른 전문 역량을 쌓는 식으로 ‘장수 커리어’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이들이다. 공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버 기사, 음식 배달원 등 일회성 계약으로, 그것도 시간 단위로 일하는 이른바 ‘긱(gig, 1920년대 재즈 연주자를 단기간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됨)’ 유형의 근로자가 많아지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라이프트렌드 2017>을 참조하자면 우버(Uber)의 기사 숫자가 이미 1백50만 명에 이르고,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오는 2025년께면 긱 이코노미가 2조7천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추산했다.
조직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원해서든 퇴직 뒤 긴 여생을 생산적으로 보낼 장기 전략에서든, 혼자 일하는 자유로움을 택했다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독자 노선에 따른 외로움과 중압감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통제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홀로움의 미학이 빛을 발한다고 많은 ‘나 홀로족’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