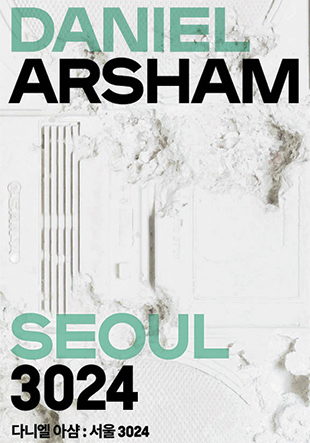다니엘 아샴, <서울 3024-발굴된 미래>展
예컨대 전시장 첫 번째 방에 있는 조각 작품 ‘푸른색 방해석의 침식된 아를의 비너스(Blue Calcite Eroded Venus of Arles)’를 보자. 우아한 자태로 한 손에는 사과를, 다른 한 손에는 부서진 거울을 들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보이는 이 조각은 루브르 박물관 ‘아를의 비너스’를 원작으로 삼았는데, 발견된 당시에도 오른팔이 없었고, 왼팔도 일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최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누구도 모르기에, 다니엘 아샴은 2020년 파리 전시를 준비하면서 ‘3020년’에 발견된 조각상이라는 가상의 스토리를 더해 재해석을 시도했다. 폭 5m에 이르는 대형 회화인 ‘숭고한 계곡, 스투바이탈(Valley of the Sublime, Stubaital)’은 ‘모든 경계를 허문다’는 아샴의 세계관이 응집된 작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스트리아 티롤에 자리한 아름다운 계곡 스투바이탈의 웅장한 풍경을 배경으로 스타워즈의 ‘알투-디투’와 ‘쓰리피오’, 그리스 장군 페리클레스, 포르셰 911 터보 등이 등장한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유적지, 건축, 조각물을 결합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원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가 미래에서 소환한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고고학적 발굴 현장을 재현한 ‘발굴 현장’이란 장소 특정적 작품을 통해 1천 년 뒤인 3024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상상했다. 휴대폰, 신발, 카메라 같은 현대적 물건이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파손되고 풍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발굴 현장’이다.
스튜디오를 둔 뉴욕을 비롯해 파리 등 여러 도시에서 ‘천 년’ 시리즈를 펼쳐온 다니엘 아샴은 전시 프리뷰 행사 때 서울을 찾았는데(세 번째 방한이라고), “반세기 또는 1세기 전의 과거와 비교하자면 세계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를 문화 예술계의 주목을 받게 한 중요한 계기인 이스터섬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2010년 커다란 얼굴 모양의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이스터섬에서 루이 비통의 ‘트래블 북(Travel Book)’ 시리즈를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석상과 컴퓨터 간의 시간적 간극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데서 발상의 단초를 얻었다. “루이 비통 여행 스케치를 하는 작가들은 며칠간 머물곤 하는데 저는 이스터섬에 6주나 보냈어요. 섬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모여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폐차, 컴퓨터 등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죠. 모아이 석상과 컴퓨터 같은 물건의 시간적 간극은 생각해보면 현재와 천 년 뒤 미래와의 간극보다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스터섬에서 뜻하지 않은 자극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오브제를 지질학적 재료를 사용해 미래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상상의 고고학’이란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다. 아마도 루이 비통 ‘트래블 북’ 프로젝트에서 스스로를 위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인물이 아닐까 싶은 다니엘 아샴. 어린 시절 허리케인을 겪은 충격으로 자연과 인공적 건축의 공존, 시간성 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됐다는 그는 어느덧 선천적 색맹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 유수 도시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를 보러 여행하는 아티스트가 됐다.
2 다니엘 아샴 전시 포스터.
3 다니엘 아샴 개인전 설치 모습. 시대와 문화,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품 2백50 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된다.
4 다니엘 아샴의 2023년 작품인 ‘분절된 아이돌(Fractured Idols)’, Fractured Idols VI, 2023, Acrylic on canvas. 285.8×250.2×8.6cm. Photo by Silvia Ros,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5 자신의 롯데뮤지엄 개인전 프리뷰 행사를 찾은 다니엘 아샴 작가. Photo by 고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