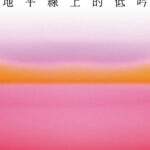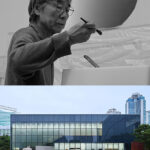아스팔트 위에 널리고 널린 자동차를 ‘세단’이라고 부른다. 길게 뻗은 보닛 밑에 엔진이 들어 있고, 앞에 두 명, 뒷좌석에 2~3명, 이렇게 4~5인용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 툭 튀어나온 엉덩이에 덮개를 달아 짐을 싣도록 한 차 말이다. 대부분 검은색, 은색, 흰색 등으로 칙칙하게 칠해져 있고, 기사를 두고 타거나, 홀로 몰거나, 택시로도 많이 이용하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가 바로 세단이다. 이런 관념 때문에 세단은 일상적이고 평범하면서 다소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세단이 제자리에서 권위만 고수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여기 소개할 여섯 대의 세단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 일상적인 세단을 상쾌하게 비튼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페이톤
폭스바겐 페이톤 후면, 폭스바겐 페이톤 앞 좌석 내부
쿠페형 세단의 인기는 날렵한 쿠페를 주로 만들던 포르쉐에 굵직한 힌트를 주었다. 커다란 세단을 타면서 젊음을 만끽하는 느낌과 드라이빙의 재미를 함께 챙기려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 동시에 포르쉐를 타다가 결혼을 하면 CLS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는 곧 포르쉐가 문짝 4개 달린 세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곧바로 포르쉐의 세단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작년 봄에 ‘파나메라’라는 이름의 포르쉐 세단이 탄생했다.
문짝이 4개 달린 포르쉐, 파나메라는 4인용 시트에 포르쉐만의 야만적인 성격을 강하게 심어놨다. 5백 마력짜리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고, 4개의 시트는 모두 허리를 꽉 움켜쥐는 ‘선수용’이었으며, 물방울을 닮은 포르쉐식 디자인도 여전했다. 이로써 주중에 출퇴근용으로 쓰이던 세단이 주말에는 자동차 경주장을 누빌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이 차, 생각보다 연비도 좋다. 가격은 대략 1억에서 3억까지,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BMW 그란투리스모
BMW 그란투리스모 내부
사장님들이 타는 덩치 큰 세단은 지구환경 따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질 않는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은 소형차 타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장님들은 커다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지구환경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가장 앞선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던 렉서스의 생각은 달랐다.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에 평민과 부자가 따로 없고, 특히 잘사는 이들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이브리드 세단, 렉서스 LS 600h는 운전기사를 두고 타는 럭셔리 세단 중 가장 청정한 배기가스를 내보내 공기를 조금이나마 덜 더럽힌다. 뒷좌석에 앉은 사장님께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안마 시트 외에도 동급 중 가장 좋은 연비와 정숙함을 함께 가져다준다. 참고로 렉서스 LS 600h는 저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전기모터의 힘으로 스르륵 움직인다. 가격은 1억8천8백50만원부터 2억5백만원까지다.
렉서스 LS 600h
렉서스 LS 600h 상단
우리는 신형 재규어 XJ에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클래식 세단 ‘재규어 XJ’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형 XJ는 수년간 XJ가 고수했던 클래식한 맛을 단번에 뒤집어버렸다. 예스러운 멋을 모두 걷어내고 온통 미래적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최초의 XJ가 출시된 1968년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 XJ라는 이름을 붙인 건 ‘엑스페리멘탈 재규어(Experimental Jaguar)’, 즉 쿠페만큼 얇고 날씬한 세단에 도전했던 ‘실험적인 재규어’였기 때문이다. XJ가 나오자마자 영국의 모든 세단은 일제히 고루해졌고, 이런 자신감이 42년이나 이어지면서 ‘XJ=클래식 세단’이라는 공식이 생겨났다. 실험적인 디자인이 42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면서 클래식 디자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신형 XJ는 달랐다. 1968년의 XJ가 했던 대로, 2010년식 ‘실험적인 재규어’로 거듭난 것이다. 신형 XJ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첨단 기술이 가득하다. 계기반만 봐도 그렇다. 신형 XJ의 계기반엔 바늘이 하나도 없다. LCD 화면에 클래식 계기반스럽게 그려놓은 것이다. 신형 XJ는 1억2천9백90만원부터 2억8백40만원까지.
재규어 XJ
재규어 XJ 내부
가장 상쾌한 소식을 전한 곳은 세단의 달인, 메르세데스-벤츠다. 1백2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며 세단의 전형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한 메르세데스-벤츠 말이다. 수년 전부터 매끈하고 날씬한 세단 만들기에 투신해온 벤츠는 얼마 전, 그 정점에 우뚝 선 신형 CLS를 내놨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CLS는 세단이다. 기다란 보닛과 4개의 문짝, 엉덩이에 트렁크까지 달린 명명백백한 세단이지만, 구석구석 세단의 권위나 지루함은 하나도 없다. 날렵한 라인과 매끈한 실루엣이 여느 쿠페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듯하다.
벤츠가 CLS를 처음 만든 2003년에는 돈 많은 사장님들이 살 수 있는 벤츠가 ‘달랑’ S 클래스뿐이었다. 운전기사를 두고 탈 사장님이라면 S 클래스가 제격이었겠지만, 직접 핸들을 잡는 ‘멋쟁이’ 사장님들은 S 클래스와 E 클래스(S 클래스보다 한 급 아래), SL 클래스(벤츠의 쿠페)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SL을 사자니 두 명밖에 못 타고, E 클래스는 몇 년 동안 탔고, 커다란 S 클래스를 몰자니 운전기사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늘씬한 쿠페형 세단 CLS가 나왔고, 이는 곧 ‘세단을 더욱 섹시하게 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쿠페형 세단’이라는 매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폭스바겐 CC가 그런 모습을 갖추었고, 현대 쏘나타까지 그런 모습으로 확 바뀌었으며, 아우디와 BMW 등도 현재 쿠페형 세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