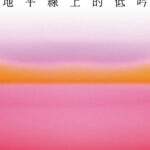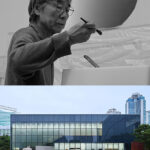세상은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그것이 편견을 부르는 색안경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몰랐거나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경계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진실의 거울일 수도 있다. ‘퀴어(queer)’라는 용어는 한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성 정체성이 다른 여러 그룹을 통칭하는 단어로 어색하지 않게 사회,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계에서 퀴어는 유행처럼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2 Patssi Valdez, ‘Portrait of Sylvia Delgado’(early 1980s), hand-painted photograph with ink and pastel, 50.8×91.4cm, Collection of Patssi Valdez 사진 제공 전
3 Martin WONG, ‘Ferocactus Peninsulae V. Viscainensis’(1997-1998), acrylic on canvas, 76x122cm, courtesy of the Martin WONG Estate and P.P.O.W Gallery. 전시 작품. 사진 제공 MOCA Taipei
4 Julie Curtiss, ‘Venus’(2016), acrylic and oil on canvas, 147x81cm, courtesy of the artist, ⓒJulie Curtis 화이트 큐브 버몬지 전시에 선보인 작품.
5 최근까지 런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는 미술관 역사상 처음으로 ‘퀴어’를 주제로 한 전시가 개최됐다. Photo by SY Ko
6 서울의 전시 공간 ‘합정지구’에서 열린 퀴어 전시 <리드 마이 립스>. 사진 제공 합정지구.
사실 ‘퀴어(queer)’라고 하면 물음표를 다는 이가 많을 것이다. 당연하다. 퀴어 아트만 해도 특정한 미술 사조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정립된 개념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굳이 ‘퀴어 작가’라는 딱지가 붙는 걸 꺼리기도 한다. 또 퀴어 감성이 있는 예술가라고 해서 다 흔히 ‘LGBTQ’로 불리는 성 소수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타계한 영국 영화감독이자 화가 데릭 저먼(Derek Jarman)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퀴어라는 단어는 해방을 뜻하기도(the word ‘queer’ is a liberation)’ 한다. 사실 퀴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문화 예술인이 퀴어 작가로 분류되고, 혹은 ‘퀴어적인’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퀴어 아티스트들은 “커밍아웃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있나요?”라고 할 정도로 소외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확실히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 밖에도 리버풀(Liverpool)의 워커 미술관(Walker Art Gallery)에서는 <Coming Out: Sexuality, Gender and Identity> 전시를 지난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었고, 런던을 대표하는 갤러리 화이브 큐브(White Cube) 버몬지에서는 <Dreamers Awake>라는 전시에서 여성 작가 50명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퀴어 아트를 다뤘다. 미국 뉴욕에는 지난 3월 세계 최초 LGBTQ 아트 전문 미술관인 레슬리-로먼 뮤지엄(Leslie-Lohman Museum of Gay and Lesbian Art)이 확장 공사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 LA 현대미술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퀴어 치카노(멕시코계 미국인)’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Axis Mundo: Queer Networks in Chicano L.A.>가 오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금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오른 만큼 개인 브랜드가 워낙 강력해 굳이 ‘퀴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올해 80세 생일을 맞은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은 그야말로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퐁피두 센터를 비롯해 미국의 게티 뮤지엄, 페이스 갤러리 등 유명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빌바오 구겐하임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퀴어 문화 행사 역시 꾸준히 열리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매년 퀴어문화축제와 퀴어영화제가 열리고, 부산에서는 올해 처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내년에 탄생 20돌을 맞이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매년 ‘퀴어 레인보우’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국, 대만 등 성 소수자의 삶과 사안을 다룬 다국적 영화를 소개한다. 국내 미술계의 움직임은 사실 다른 문화 영역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덜한 편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해오며 2013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과 2015년 아시아퍼시픽 트리엔날레, 광저우 아시아 비엔날레 등에 초청된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LGBTQ 이슈를 그리며 지난여름에 영화 <헤더윅> 재개봉을 기념한 스페셜 포스터를 작업하기도 한 전나환 작가 등이 그나마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지난 5월에는 전시 공간 ‘합정지구’에서 <리드 마이 립스>라는 퀴어 전시가 열렸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이의성, 팟캐스트 ‘퀴어방송’의 진행자인 리타, 퀴어 싱어송라이터이자 퍼포머인 이반지하, 그리고 오용석, 이미래, 이은새 등의 작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퀴어를 이야기했다. 이렇듯 소규모 갤러리나 전시 공간에서 퀴어를 다루는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국공립 미술관의 문은 아직까지 굳게 닫혀 있다.그나마 이 정도로 퀴어 문화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외려 퀴어 문화가 눈에 띌수록 그런 반감이 덩달아 심해지는 현상도 있다. 지난 10월에 열릴 예정이던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성 정체성이 예술성을 폄하하거나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적어도 문화 예술 영역을 놓고 보면 말이다. 예술가와 사회운동가의 작지만 꾸준한 행보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QUEER ART SPECIAL]
– Defying Categorization 기사 보러 가기
– Queer Art Now 기사 보러 가기
– LGBTQ 현대미술, 역사적 전개와 그 이후 기사 보러 가기